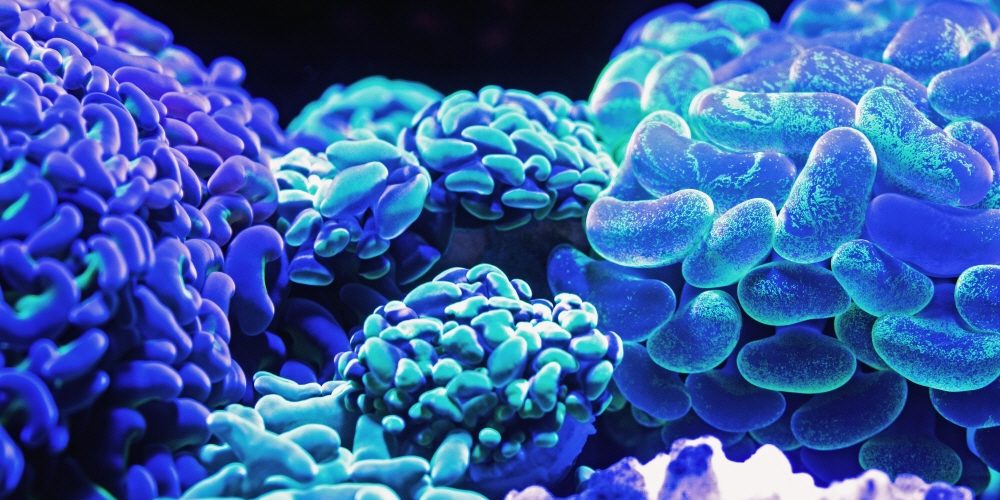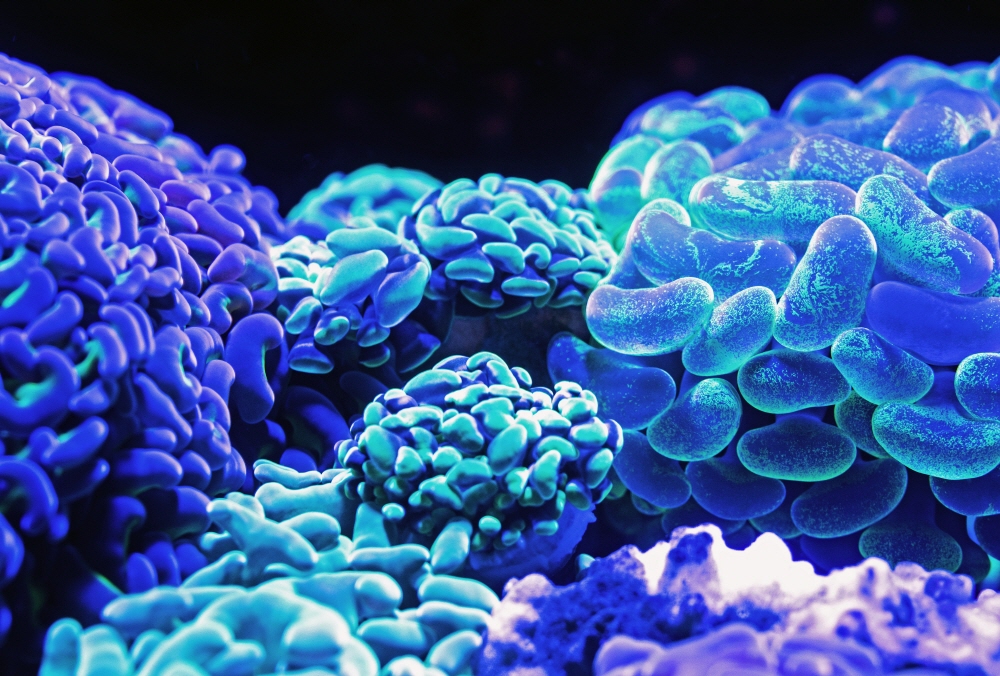
옥스퍼드 대학 출판국이 2024년의 단어로 선정한 뇌 부패(brain-rot)는 SNS에 흐르는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멍하니 계속 보며 정신 상태나 지성이 저하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뇌 부패라는 상태와 현대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일상적으로 SNS를 사용하며 정신 차려보니 자유 시간 대부분을 SNS를 보며 보냈다는 경험이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 주립대학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인 마수드 키안푸르는 학생에게 소셜 미디어와 사회 관계에 대해 가르치면서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미루게 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주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21세기 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했을 당시에는 이들이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촉진하며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가능성이 있다며 환영받았다. 확실히 소셜 미디어에는 이런 기능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오정보를 퍼뜨리고 커뮤니티 양극화를 진행시키는 에코 챔버 현상을 일으키는 문제도 발생했다.
미국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하루 평균 스크린 타임이 5시간을 넘고 받는 알림은 평균 23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4분에 1번 꼴로 뭔가의 알림을 받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끊임없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문화 속에서 젊은이는 미용 인플루언서와 자신을 비교해 자존감이 상처받거나 성공을 외치는 유해한 남성 문화에 물들고 있다. 문화 이론가는 이들을 스토리텔링 쇠퇴의 표출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현대인은 끊임없는 단편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고 항상 뭔가에 관여하는 걸 요구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야기에 깊고 장기적으로 관여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토론토 주립대학 연구팀은 2024년 젊은 노동자가 일에 뭘 원하는지라는 주제에 관해 2분 40초 동영상을 제작했지만 학생은 이 길이 동영상조차 너무 길게 느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연구팀은 학생 흥미를 끌기 위해 동영상을 단 16초짜리 클립으로 편집했다.
키안푸르는 현대 미디어와 기술은 기억을 보존하고 역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게 해주지만 기억이란 역설적인 것이며 기억하는 행위 모두에 망각과 부재가 수반되는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이나 그곳에서 공유되는 콘텐츠 대부분은 일시적인 것이며 의미 있는 문화적 표현이 아닌 표면적인 관여에 향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이런 플랫폼은 문화적 기억 상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다양한 콘텐츠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콘텐츠마다 깊이 생각하거나 관여하는 이는 거의 없다. 그 결과 이런 콘텐츠는 곧 풍화되고 잊혀지고 만다는 것이다.
그는 뇌 부패가 확산됨에 따라 깊은 사고나 자기 성찰 능력이 상실되고 진실이 중시되지 않게 되어 가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발언이나 거짓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는 발언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문제시하지 않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거짓말이나 과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지지자는 진실이나 허위를 신경 쓰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걸 시사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콘텐츠에 노출되어 스토리텔링 능력이 상실되고 의미 있는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독일 철학자인 게오르크 짐멜은 20세기 초반 도시에 사는 사람은 압도적인 자극에 노출된 결과 방어 반응으로 다양한 일에 무관심해진다고 지적했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안푸르는 인간은 항상 이야기에 매료되어 왔다며 자신을 이해하려면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소셜 미디어가 갖춘 이익 유도형 알고리즘은 경험을 균질화하고 최종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해친다며 스토리텔러가 아닌 스토리셀러(storysellers) 그러니까 이야기를 파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