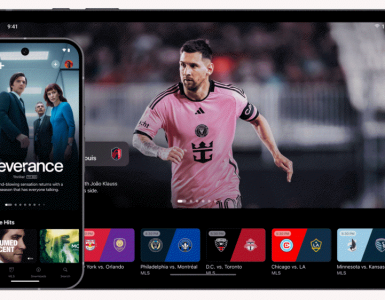개와 토끼 같은 동물들은 소리에 반응해 귀를 쫑긋 세우거나 떨린다. 이 움직임은 동물 고막에 소리를 집중시켜 소리를 정확히 특정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능력이다. 독일 자를란트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에게도 소리에 반응해 귀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세기 후반 활동했던 독일 해부학자 로버트 베이더하임은 그의 저서 ‘인간의 구조’에서 인간에게는 86개 흔적 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흔적 기관은 퇴화로 인해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형태만 남아있는 기관으로 대표적인 예로 남성 유두, 미골, 사랑니 등이 있다.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이개근도 흔적 기관 중 하나다. 많은 동물은 소리에 반응해 귀를 움직일 수 있지만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이 기능을 완전히 또는 거의 상실했다. 일부는 의도적으로 귀를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비율은 1,000명 중 1명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인 이개근은 작고 약한 힘만 낼 수 있지만 인간 먼 조상에게는 이개근이 여전히 강하게 발달해 있어 귀를 앞뒤로 움직여 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포착해 청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자는 이개근 능력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참가자 20명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고 귀 위와 뒤에 있는 상이개근과 후이개근의 전기 활동을 추적했다. 참가자는 방음실에 앉아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된 상태에서 실내에 흐르는 오디오북을 듣는다. 방음실에는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팟캐스트도 함께 흘러나온다.
오디오북과 팟캐스트 음량 등을 조정해 난이도를 저, 중, 고 수준으로 나누고 12회 실험을 반복해 소리가 들리는 위치와 이개근 작용에 대해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듣고 싶은 오디오북 소리가 뒤에서 들릴 때는 소리가 정면에서 들릴 때보다 피험자 후이개근이 더 활발하게 활동했다. 또 상이개근은 소리 방향에 따른 영향은 받지 않았지만 청취 수준이 올라가면 더 활발하게 작용했다. 연구자는 후이개근은 시야 밖에서 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데 조상이 활용했던 흔적 기관으로 여겨진다며 또 상이개근은 사람이 얼마나 의식적으로 듣기 위해 노력하는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네소타 대학 연구자 매튜 윈은 이 연구로 이개근이 소리를 포착하기 위해 활동한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며 이개근 반응은 소리에 대해 경계심을 높인 상태나 소음에 대한 좌절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논문 공동 저자인 미주리 대학 스티븐 핵클리에 따르면 연구에서 관찰된 귀 움직임이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작용이라 해도 청각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작은 움직임이라고 한다며 다만 이런 연구 결과는 보청기 보조 등 실용적인 용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