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3월 21일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Google News Initiative)를 발표했다. 구글은 이번 발표가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 융성에 일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은 언론업계와 협력하는 예로 오픈소스 모바일 최적화 페이지를 위한 AMP(Accelerated Mobile Pages), 손쉬운 영상 배포를 돕는 유튜브 플레이어, 구글 내 뉴스 콘텐츠 검색을 위한 플랙서블 샘플링(Flexible Sampling), 뉴스룸 파트너십을 위한 구글 뉴스랩(Google News Lab), 유럽 언론 혁신을 위한 디지털 뉴스 이니셔티브(Digital News Initiative) 등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지난해에만 언론 파트너에게 126억 달러를 지원했고 무료로 언론사 웹사이트로 월 100억 회 트래픽을 가져다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한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를 두고 구글 측은 뉴스의 미래를 위해 제품과 파트너십 등을 한데 모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가 초점을 맞추는 건 크게 고품질 저널리즘 강화, 언론사 비즈니스 모델 진화, 언론사의 기술 혁신 역량 강화 3가지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붕괴되어 있는 시장일 수도 있지만) 구독 모델 그러니까 언론사의 수입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제품인 서브스크라이브 위드 구글(Subscribe with Google)이 눈길을 끈다. 구글이 선보인 구독 플랫폼인 것이다. 구글은 구독 절차를 간편하게 바꿔 더 많은 독자가 저널리즘 콘텐츠를 빨리 소비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시도를 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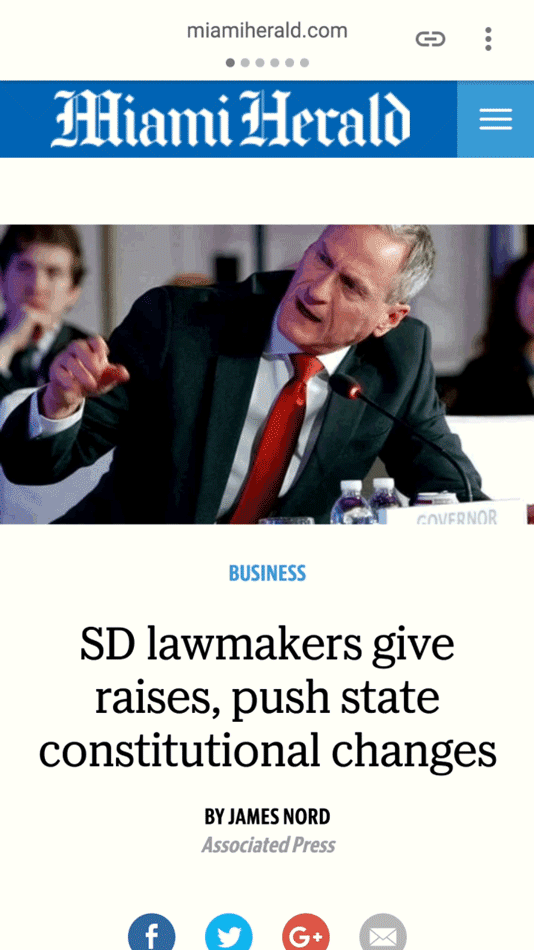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뉴스 사이트가 쏟아졌다. 국내에선 극소수지만 해외에선 월정액을 내는 과금 모델을 도입한 곳도 많다. 문제는 수많은 사이트마다 아이디나 결제를 위해 제각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가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다. 구글 구독 서비스는 구글 계정을 이용해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결제도 구글페이(Google Pay)로 처리할 수 있어 독자 입장에선 더 쉽게 뉴스 사이트 가입이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구글 구독 서비스는 구글 계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료 뉴스 사이트가 있다면 월이나 연간 지불 등 과금 종류만 고르면 사이트마다 일일이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 결제는 앞서 밝혔듯 구글페이로 처리할 수 있어 역시 사이트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이런 몇 가지 탭 처리만으로도 가입 처리를 끝낼 수 있는 것. 덕분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필요 없이 원하는 기사를 계속 읽을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기만 하면 다른 기기에서도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구글 검색 결과에서도 구독 페이지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구글이 말하는 양질의 기사에 대한 접근성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밝혔듯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을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당장 구글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북미와 남미 일부, 유럽, 호주 등지이며 아시아에선 일본이 유일하다. 미국에선 뉴욕타임스와 USA투데이, 워싱턴포스트 등이 참여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와 텔레그래프,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선 아웃스탠딩 같은 곳이 유료화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아웃스탠딩은 지난 2016년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7년 1주년을 맞아 아웃스탠딩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총 결제 수는 4,000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정기구독자다. 아웃스탠딩의 프리미엄 멤버십 구성을 보면 월 기준으론 9,900원이며 연간 결제는 11만 8,800원이다. 이렇게 보면 절반이 연간 결제를 했다고 보면 연간 2억 3,000여 만원 이상 구독 수익을 얻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구독 모델을 진행하려는 언론사가 있다면 인프라를 직접 만들 필요가 없고 구독 수요 조사까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구글에 따르면 더블클릭 인프라를 이용해 머신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구독 의향 실험도 진행 중이다. 잠재 고객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인 뉴스 소비자 인사이트를 통해 구독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구글이 예로 든 걸로 따지면 세인트루이스 디스패치의 경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구독 페이지 조회수가 150% 늘었고 구독도 전월 동기보다 3배 증가했다고 한다.
구독 모델은 언론사 입장에서 관심을 두는 유료화 모델 중 하나인 건 분명하다. 해외에선 시도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블렌들(Blendle. https://launch.blendle.com) 같은 서비스도 이 같은 예 가운데 하나다. 구글 구독 서비스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블렌들 역시 유럽에서 먼저 성공을 거둔 과금 플랫폼으로 iOS와 안드로이드를 통해 서비스한다.
블렌들은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네덜란드 스타트업이다. 인터넷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기사를 콘텐츠로 서비스하며 기사당 10센트에서 80센트 사이에 판다. 또 독일 미디어 기업인 엑셀 스프링거(Axel Springer), 미국 뉴욕타임스 등으로부터 380만 달러 출자를 받으면서 네덜란드에 이어 독일에도 2016년 진출했고 미국에도 진입했다.
블렌들의 경우 신문이나 잡지를 기사당 구입할 수 있고 유료이기 때문에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또 기사 내용에 만족하지 않으면 반품 처리할 수도 있다.
블렌들 같은 유료화 수익 모델은 독자가 콘텐츠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줄 계기를 마련해줄 수도 있다. 물론 이 같은 얘기는 구글 구독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구글 같은 기업 입장에선 플랫폼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언론사 입장에서 이 같은 시도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왜 유튜브가 신라면 광고를 만들어줬냐는 물음이 떠오를 수도 있다. 유튜브가 제작해준 맛있는 신라면의 소리(The Sound of Delicious Shin Ramyun)는 현재 5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구글 빅데이터와 리서치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를 선물(?)한 것이다. 어차피 유튜브의 핵심 모델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광고 그리고 유튜브 레드 같은 유료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광고 영상 제작 자체가 핵심 비즈니스는 아닌 것이다. 기사 내에도 나온 것처럼 “자신의 핵심 비즈니스가 다른 누군가의 보완재가 될 때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외보다 국내는 유료 모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하다(여러 이유로). 사실 기존 언론사 입장에선 자사의 비즈니스 핵심 모델이 플랫폼의 보완재라는 걸 알려줄(지금이 네이버 종속적이듯) 예 가운데 하나가 될 정도일 수 있다. 반면 아웃스탠딩의 예처럼 뉴미디어에는 가능성을 키울 방편이 되어줄 수도 있다. 또 구독 모델을 제공하는데 크라우드펀딩 형태는 제공하지 말란 법도 없다.
구글 구독 모델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젠 노하우(Know how)가 아니라 노웨어(Know where) 시대라고 말한다. 단순 구독 모델 역부를 떠나 이 같은 기술 혁신 시대에는 기술을 잘 찾고 활용할 줄 아는 게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어차피 플랫폼은 점점 빅브라더가 되고 언론사는 영세화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직접 개발하고 만드는 것보다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어쨌든 이 같은 플랫폼의 제공 모델은 기존 콘텐츠 제작 지형을 장기적으론 1인까지도 장벽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열린 시장으로 바꿔버릴 가능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당신은 콘텐츠만 만들어라.”




